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 기자회견서 주장
ESG 평가 기준 단일화는 획일화... 잘못된 방향
금융당국, ESG 평가주체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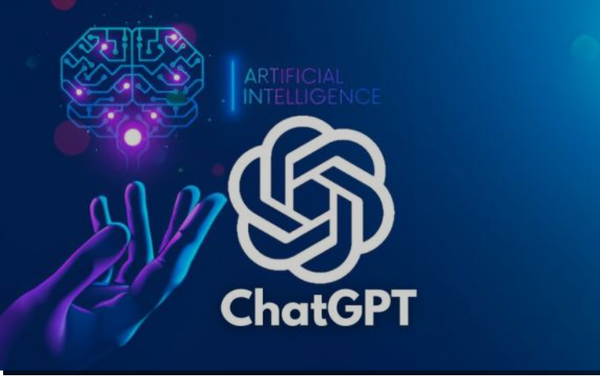
[ESG경제=이신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ESG평가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활용이 알고리즘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평가 주기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ESG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연구소장인 정석오 한국외국어대 통계학과 교수와 서스틴베스트 정다솜 선임연구원은 18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ESG평가와 AI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사람에 따른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절차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이 높아져 ESG 평가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 ESG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현재 시점과 평가 시점의 괴리를 줄일 수 있고, 평가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시간을 줄여 평가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의 활용은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적인 평가뿐 아니라 미래의 시나리오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ESG 평가를 가능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하지만 전문가들은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최근 챗GPT가 가짜뉴스에 기반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ESG평가를 AI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이슈나 규제가 계속 등장하는 ESG의 영역에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모델은 친환경 공급망 이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회색지대의 문제는 결국 평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소장과 정 선임연구원은 “인간들도 합의하지 못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정책 및 규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ESG 이슈 평가를 AI라는 블랙박스에 맡긴다고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AI 기술은 ESG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ESG 평가사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 업무에서 벗어나 복잡한 영역에 대해 고찰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정하고 소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전무는 ESG에 관한 오해를 지적했다. “ESG 평가기준은 단일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단일화는 곧 획일화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ESG 평가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ESG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평가업체나 기관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제정 ▶평가모델의 공개 ▶평가업무와 컨설팅 등 다른 서비스와 이해상충 해소 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정부 규제로 강제하거나 ESG평가기관을 인가하는 등의 직접적 정부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